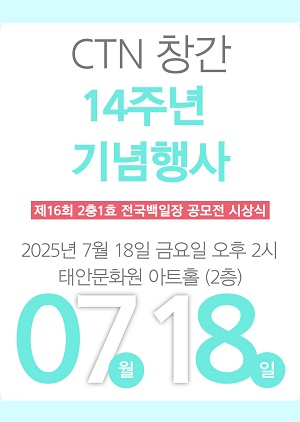[유태희의 문화산책] 석천한유도를 아십니까
정민준 기자입력 : 2023. 03. 30(목) 17:04

▲유태희(시인, 소설가 · 극작가 · 사진작가 · 예술인협동조합 ‘이도의 날개’ 창작공동체 대표 · 세종행복도시필하모니오케스트라 대표)
흔히 눈썰미가 있다는 말은 어느 것을 한 번 보면 금세 알아내는 능력을 이른다. 여기 조선시대 후기에 활약한 화원 김희겸의 작품을 감상해보자. 「와운누계창(臥 樓溪漲)」 (1756), 「안음송대(安陰松臺)」, 화첩으로 『불염재주인진적첩(不染齋主人眞籍帖)』, 「석천한유(石泉閒遊)」, 궁중 기록화로 『준천계첩』(1760) 등을 보시라. 곧바로 우리가 화성( 聖)으로 추앙하는 겸재 정선이 떠오른다면 눈썰미가 있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겸재 정선을 살펴보면 17~18세기 ’진경시대‘를 열어젖혔던 화원이다. 겸재는 화가로서 두 개의 큰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그가 중년기 이후 사실적인 풍경화에 심취해서 그 독보적인 겸재 화법을 세운 것이다. 즉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한국적 산수화의 정착과 독자적인 전개에 크게 이바지한 선구자적인 화원이다. 당시의 화단은 중국 송대(宋代)ㆍ원대(元代)ㆍ명대(明代)의 그림들을 비판 없이 모방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돌연변이처럼 출현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화단의 새로운 이해와 활로를 열었다. 또 하나의 얼굴은 겸재 정선이 그린 산수화의 작품들은 대부분 남송화풍(南宋畵風)이 의식적으로 시도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송화풍(北宋畵風) 일변도의 당시 화단에 새로운 화풍을 불어넣은 것이다. 이런 겸재 선생이 뿌린 씨앗은 훗날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열매를 맺었다. 즉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가 지니는 의의는 정형(定型)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한국 산수화의 정립에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석천한유도를 그린 김희겸도 여기에 속한다.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는 조선 후기의 무신 전일상(田日祥, 1694∼1760)의 모습과 생활상을 그린 초상화와 풍속화로 1987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화원 김희겸(金喜謙 : 화원 김희성과 동일 인물)의 1748년(영조 24) 작으로 당시 생활상을 묘사한 풍속화이다. 전일상은 본관이 담양(潭陽)으로, 5대를 연이은 무관(武官) 집안에서 태어나 역시 무관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무관인 전운상(田雲祥)의 아우이기도 하다.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에는 “무진년 6월 일에 제작함(戊辰日製)”이라는 관지(款識)와 “김희겸(金喜謙)”이라는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찍혀 있다. 무진년은 그가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를 지냈던 1748년이다.
TV쇼 진품명품에서 감정가 15억이라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석천한유도'는 전주 출신의 화원이다. 그는 1748년 어진을 다시 그리는 개모(改模)할 때 참여하여 그 공으로 변장(邊將)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초상으로 이름이 높았던 탓인지 무관 전일상의 초상을 제작하는 일에 초청받고초청을 받고 그때 「석천한유도」를 함께 그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에서 무인의 호걸스러운 모습이 표현되었다고 평한다. 누각 위 난간에 기댄 주인공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매, 그리고 바로 위 기둥에 걸려 있는 칼, 누각 아래에 건장한 체구에 험상궂게 생긴 마부가 물로 씻기고 있는 말, 담배와 술 시중을 들거나 가야금으로 흥취를 돋우는 관기(官妓) 등이 무인을 상징하는 소도구들이다. 한가로운 장면 속에도 무장의 기개와 풍류가 함께 어우러져 버드나무마저 그 가락에 흥겨워하는 김희겸의 서사적 코스튬(costume)이기도 하다. 그는 화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나누어 계화(界畵)로 그린 누각을 화면 오른쪽 위에, 세마(洗馬)의 장면을 왼쪽 아래에 두어 실내와 실외의 생활상을 적절히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버드나무의 휘날리는 방향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누각의 풍경에서 세마의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한다. 또 한 담채(淡彩)와 담묵(淡墨)으로 부드럽게 표현하였고, 나무와 언덕에 드문드문 청록의 태점을 찍고 기둥에 약하게 음영을 넣어 화원식의 채색 화풍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표현 기법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는데 전일상의 얼굴 표현을 보면, 초상화의 기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골격과 살결을 정확히 묘사하는 육리문(肉理文)으로 수염을 자세히 표현하고 갈색으로 살빛을 내었다. 옷의 선묘는 기필(起筆)을 못대가리처럼 세게 하고 서서히 쥐 꼬리와 같이 가늘게 선을 긋는다는 정두서미묘(丁頭鼠尾描)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고자에도 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이를테면 풍속화에 초상화의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인물의 묘 선은 변화가 적고 가는 유사묘(游絲描) 계통이다. 이 그림은 무인의 생활상을 그린 풍속화이고, 풍속화에 초상화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표현 기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우리 옛 그림들은 당시 화원들이 느끼는 고뇌와 삶을 나름의 해결 방식으로 내놓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신윤복이 그린 ‘연당의 여인’과 ‘기다림’의 기생의 모습에서 겉으론 화려해 보였으나 사실은 사회적 멸시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기생은 가난한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 존재임을 전하기도 한다. 김정희의 ‘세한도’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통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의리와 배신을 전해주며 영조의 초상화를 통해 복수가 아닌 성군으로 거듭나 나라를 부흥시키는 임금의 변화를 얼굴로 살펴볼 수 있는 등 그림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연계하여 감상하며 지적 유희와 감성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겸재 정선을 살펴보면 17~18세기 ’진경시대‘를 열어젖혔던 화원이다. 겸재는 화가로서 두 개의 큰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그가 중년기 이후 사실적인 풍경화에 심취해서 그 독보적인 겸재 화법을 세운 것이다. 즉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한국적 산수화의 정착과 독자적인 전개에 크게 이바지한 선구자적인 화원이다. 당시의 화단은 중국 송대(宋代)ㆍ원대(元代)ㆍ명대(明代)의 그림들을 비판 없이 모방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돌연변이처럼 출현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화단의 새로운 이해와 활로를 열었다. 또 하나의 얼굴은 겸재 정선이 그린 산수화의 작품들은 대부분 남송화풍(南宋畵風)이 의식적으로 시도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송화풍(北宋畵風) 일변도의 당시 화단에 새로운 화풍을 불어넣은 것이다. 이런 겸재 선생이 뿌린 씨앗은 훗날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열매를 맺었다. 즉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가 지니는 의의는 정형(定型)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한국 산수화의 정립에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석천한유도를 그린 김희겸도 여기에 속한다.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는 조선 후기의 무신 전일상(田日祥, 1694∼1760)의 모습과 생활상을 그린 초상화와 풍속화로 1987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화원 김희겸(金喜謙 : 화원 김희성과 동일 인물)의 1748년(영조 24) 작으로 당시 생활상을 묘사한 풍속화이다. 전일상은 본관이 담양(潭陽)으로, 5대를 연이은 무관(武官) 집안에서 태어나 역시 무관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무관인 전운상(田雲祥)의 아우이기도 하다.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에는 “무진년 6월 일에 제작함(戊辰日製)”이라는 관지(款識)와 “김희겸(金喜謙)”이라는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찍혀 있다. 무진년은 그가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를 지냈던 1748년이다.
TV쇼 진품명품에서 감정가 15억이라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석천한유도'는 전주 출신의 화원이다. 그는 1748년 어진을 다시 그리는 개모(改模)할 때 참여하여 그 공으로 변장(邊將)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초상으로 이름이 높았던 탓인지 무관 전일상의 초상을 제작하는 일에 초청받고초청을 받고 그때 「석천한유도」를 함께 그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에서 무인의 호걸스러운 모습이 표현되었다고 평한다. 누각 위 난간에 기댄 주인공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매, 그리고 바로 위 기둥에 걸려 있는 칼, 누각 아래에 건장한 체구에 험상궂게 생긴 마부가 물로 씻기고 있는 말, 담배와 술 시중을 들거나 가야금으로 흥취를 돋우는 관기(官妓) 등이 무인을 상징하는 소도구들이다. 한가로운 장면 속에도 무장의 기개와 풍류가 함께 어우러져 버드나무마저 그 가락에 흥겨워하는 김희겸의 서사적 코스튬(costume)이기도 하다. 그는 화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나누어 계화(界畵)로 그린 누각을 화면 오른쪽 위에, 세마(洗馬)의 장면을 왼쪽 아래에 두어 실내와 실외의 생활상을 적절히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버드나무의 휘날리는 방향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누각의 풍경에서 세마의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한다. 또 한 담채(淡彩)와 담묵(淡墨)으로 부드럽게 표현하였고, 나무와 언덕에 드문드문 청록의 태점을 찍고 기둥에 약하게 음영을 넣어 화원식의 채색 화풍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표현 기법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는데 전일상의 얼굴 표현을 보면, 초상화의 기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골격과 살결을 정확히 묘사하는 육리문(肉理文)으로 수염을 자세히 표현하고 갈색으로 살빛을 내었다. 옷의 선묘는 기필(起筆)을 못대가리처럼 세게 하고 서서히 쥐 꼬리와 같이 가늘게 선을 긋는다는 정두서미묘(丁頭鼠尾描)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고자에도 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이를테면 풍속화에 초상화의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인물의 묘 선은 변화가 적고 가는 유사묘(游絲描) 계통이다. 이 그림은 무인의 생활상을 그린 풍속화이고, 풍속화에 초상화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표현 기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우리 옛 그림들은 당시 화원들이 느끼는 고뇌와 삶을 나름의 해결 방식으로 내놓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신윤복이 그린 ‘연당의 여인’과 ‘기다림’의 기생의 모습에서 겉으론 화려해 보였으나 사실은 사회적 멸시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기생은 가난한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 존재임을 전하기도 한다. 김정희의 ‘세한도’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통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의리와 배신을 전해주며 영조의 초상화를 통해 복수가 아닌 성군으로 거듭나 나라를 부흥시키는 임금의 변화를 얼굴로 살펴볼 수 있는 등 그림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연계하여 감상하며 지적 유희와 감성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